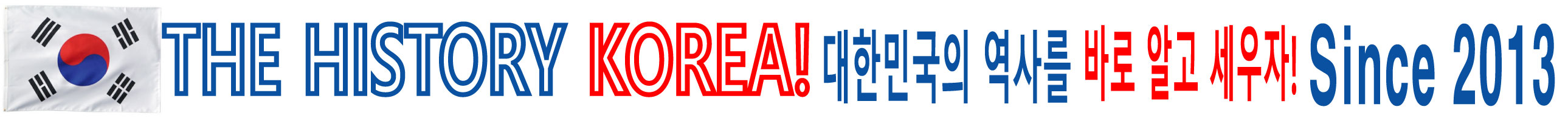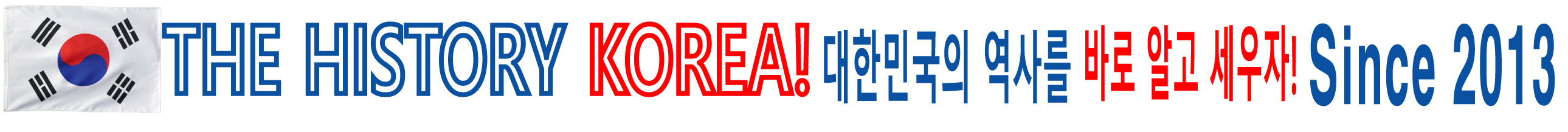상세 컨텐츠
본문


말갈의 계통에 대해서는 숙신, 읍루, 물길, 말갈, 여진으로 이어지는 퉁구스계 종족이라는 일원적 계통론과 말갈로 통칭되는 집단 속에 예맥계(濊貊系)와 숙신계(肅愼系)가 섞여 있다는 다원적 계통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일원적 계통론은 혈연적 동질성에 다원적 계통론은 문화적 동질성에 초점을 두며 수나라, 당나라 시대에 걸쳐서 중원 대륙의 중국인이 동북아시아 이종족을 낮추어 불렀던 비칭(卑稱)이란 견해와 고구려의 일부 피지배 주민을 가리키는 종족명이었다는 설이 있다. 말갈의 의미로는 원음(原音)이 Moxo 또는 Moho로서 여진어의 물(水)을 뜻하는 Muke와 연결하는 견해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 ‘말갈은 물가에 사는 사람들’의 뜻이다. 말갈의 계통에 대해서는 숙신, 읍루, 물길, 말갈, 여진으로 이어지는 퉁구스계 종족이라는 일원적 계통론과 말갈로 통칭되는 집단 속에 예맥계(濊貊系)와 숙신계(肅愼系)가 섞여 있다는 다원적 계통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불열부, 철리부, 월희부는 8세기에 당나라에 자기 부의 이름으로 조공을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때 수서(隋書)의 말갈 7부 부족은 당시에 알려진 대표적인 부였고 각 부 아래에는 다시 작은 부들이 속하여 있었으며 당나라 때가 되면 일부 세력은 소멸하였고 주변부에 흡수되어서 새로운 부명으로 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말갈의 거주 지역은 만주 동북부의 송화강과 목단강, 흑룡강 일대에 넓게 분포하였는데 속말부를 기준으로 할 때 백돌부(伯咄部)는 속말부의 북쪽에 안거골부(安車骨部)는 백돌부의 동북쪽에 불열부(拂涅部)는 백돌부의 동쪽에 호실부(號室部)는 불열부의 동쪽 지방에 흑수부(黑水部)는 안거골부의 동북쪽에 백산부(白山部)는 속말부의 동남쪽에 있었다고 한다.이 중 불열부, 철리부(鐵利府), 월희부는 8세기에 이르러서 당나라에 자기 부의 이름으로 조공을 하였다.
숙신 (肅愼) - 주대(周代)에 아시아 동북방에 살던 북적을 일컫던 말이다. 식신(息慎), 직신(稷慎), 주신(朱申)이라고도 불렸다. 여진어를 차음(借音)한 글자다. 여진어로 jušen 주션이라고 발음한다.
읍루 (挹婁) - 옛 숙신의 나라이다. 부여(夫餘)에서 동북쪽 천여리 거리에 있다. 동쪽은 큰 바닷가에 이르고 남쪽은 북옥저에 접하며 북쪽은 그 끝이 어디인지 잘 알 수가 없다. 땅은 산이 많고 험하며 사람의 형상은 부여인과 닮았으나 그 말은 각각 다르다. 오곡과 베가 있고 붉은 옥이 나오고 담비가 좋으며 군장은 없으나 읍락 각각에 대인(大人)이 있다. 산림 사이에 살며 몹시 추우며 항상 토굴에 있어 깊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큰 집은 사다리 아홉 개에 이른다. 돼지 기르기를 즐겨 그 고기를 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는다. 겨울에는 돼지 기름을 두껍게 나누어 몸에 발라 이로써 바람과 추위를 막는다. 여름에는 벌거벗고 앞뒤를 베로 가린다. 사람 냄새가 많이 나고 더러움을 잘 알지 못하여 변소를 가운데 짓고 그 주위에 살았다. 한나라 때에 부여에 속하고 무리는 비록 적으나 용력이 많고 산세가 험한 곳에 살고 또한 활을 잘 쏘니 능히 사람의 눈을 맞추었다. 활의 길이는 네 척이고 노와 같은 힘이 들고 화살은 싸리나무를 사용하고 그 길이는 일척팔촌이다. 푸른 돌을 화살촉으로 하고 촉에는 모두 독을 발라서 보통사람은 바로 죽었다. 편안히 배를 타고 도둑질을 좋아하니 이웃나라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였으나 능히 복속시키지 못하였다. 동이와 부여는 음식의 종류를 모두 조두그릇을 사용하는데 오직 읍루만은 그렇지 않아 법과 풍속이 가장 기강이 없다.
물길 (勿吉) - 물길은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둥베이(東北)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에 거주한 퉁구스계의 여러 민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만주족의 선조로 뒤에 7부로 나뉘었으며 속말 말갈(粟末靺鞨)을 중심으로 발해를 세웠는데 흑수 말갈(黑水靺鞨)은 이에 대립하여 나중에 금나라(金)를 건국하였다.
속말부 (粟末部, 속말말갈, 粟末靺鞨) - 말갈족(靺鞨族)의 7부 가운데 한 부족이다. 668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불복하고 당나라에 대항하였으나 실패하여 당나라의 영주(營州)로 강제로 이주를 당했고 후일에 영주를 탈출하여 백산말갈(白山靺鞨)과 대조영(大祚榮) 집단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과 함께 발해(渤海)를 건국하는데 있어서 큰 활약을 하였다.
흑수부 (黑水部, 흑수말갈, 黑水靺鞨) -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수서(隋書)에서 말갈 7부로써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참고로 말갈 7부에 대한 위치를 비정한 것은 학자들마다 모두 다르다. 그중에서도 흑수말갈이 가장 위치의 논란이 크다. 흑수말갈은 아무르강과 송화강이 만나는 유역 부근에서 살아가던 부족이었는데 추운 지방에서 살았지만 보통의 유목민족과는 다르게 돼지를 길러서 도축하여 고기를 먹었고 돼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등 농경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만주족은 반은 농사를 지었고 반은 목축업을 하던 민족이었다. 다른 말갈 부족 보다 혼혈 혈통의 인종이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한국사에서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북흑수말갈이 주필산 전투에서 동원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보인다. 발해 초기 때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말갈 추장 예속리계가 당나라와 동맹하여 발해의 후방을 공격했다. 발해 무왕은 동생 대문예를 시켜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문예는 무왕에게 공격을 하지 말자고 했고 그러자 발해 무왕이 대문예를 죽이려고 했다. 대문예는 도망을 쳤고 당나라로 망명하였다. 발해 무왕이 당나라를 공격한 이후 흑수부는 발해에 복속되었다. 9세기 후반에 흑수말갈이 보로국과 함께 신라 헌강왕에게 화친을 청하였는데 발해 중기에서 후기 시점에 흑수부는 발해에서 사실상 독립한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해석한다. 이후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이후에는 거란에 복속한 숙여진과 달리 거란을 거부해 생(生)여진이 되어서 생업을 이어간다. 후삼국시대에 고려와 후백제(後百濟)의 최후의 결전인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 장수 유금필이 튀르크 계통의 유목민족인 철륵과 말갈족의 일파인 달고 및 흑수족 기병들을 이끌고 활약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흑수족이 바로 흑수말갈이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서기 1081년에 서여진(西女眞) 17인이 고려에 망명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 문종은 흑수여진(黑水女眞)의 정착을 금지하는 기존 정책과 반대로 그들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흑수여진이라는 집단이 존재한 것인지 흑수말갈과 여진족을 구별해야 하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하지만 11세기까지도 흑수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고 흑수말갈은 고려(高麗)에서 이민족으로 차별을 받았다.
*본인 작성, NAVER 국어사전, 나무위키(https://namu.wiki/w/%ED%9D%91%EC%88%98%EB%A7%90%EA%B0%88),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C%9D%8D%EB%A3%A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802 ) 참고.
'상고시대 고조선-부여시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한 辰韓 12국-사로국 6부 (0) | 2025.03.21 |
|---|---|
| 마한 馬韓 54국 소국 연맹체 (0) | 2025.03.17 |
| 백제 마한-신라 변한가야 병합 (0) | 2024.10.02 |
| 부여국 여러 갈래 과정 정리 (0) | 2024.01.22 |
| 5~6세기 가야 연맹 왕국 (0) | 2023.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