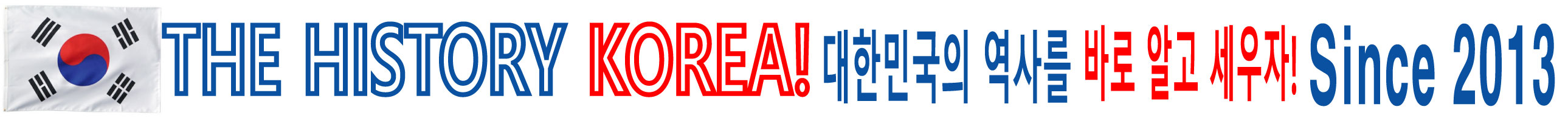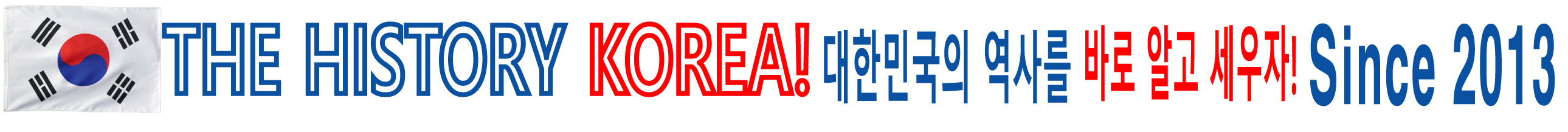상세 컨텐츠
본문


도교(道敎)는 간단히 말해서 신선 사상(神仙思想)을 밑바탕으로 하여 노장사상(老莊思想), 유교(儒敎), 불교(佛敎)와 여러가지 신앙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생겨난 종교이다. 중국 대륙에서는 기원전부터 산악신앙(山岳崇拜)과 관련된 신선신앙(神仙崇拜), 수련을 통한 불로장생(不老長生) 또 등 초인적인 힘을 얻으려는 방술(方術)이 존재하였다. 신선방술은 중국 대륙의 전한 시대(前漢) 말기에 대두한 황로신앙(黃老信仰)이 더해지고 불교(佛敎)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인 교리(敎理)와 체계(體系)를 갖추면서 도교가 탄생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도교가 전래된 이후에 우리 고유의 신선사상과 중국의 수련적 도교가 합쳐지고 발달하면서 발전하여 이어졌다. 그리고 양생(養生), 의학(醫學), 삼재 예방(三災豫防), 입택(入宅) 등 여러가지 생활 환경의 활동과 분야에서 도교의 방법론을 활용되었다. 그리고 일본(日本)으로 전해졌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중국에서는 신선설이 생겨났다. 이 신선설은 중국 고대에 있었던 산악신앙(山岳信仰)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여기에 중국 종교의 원초적 형태인 무술(巫術), 자연숭배 등의 사상이 합쳐져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의 방술(方術)이 생겨났다. 이 방술은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성립되어 민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방술을 행사하는 사람을 방사(方士)라고 하는데 방사가 제왕과 밀접하게 된 것은 진나라 황제였던 진시황(秦始皇) 재위 기간이었고 한무제(漢武渧) 때에는 제왕 측근에서 거의 떠나지 않을 정도였기에 방술은 상위 계층의 사회에서 뿌리를 깊게 내렸다. 신선설이나 방술은 위로할 곳이 없는 일반 백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에 이르러서 종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전한(前漢) 말부터 전설의 임금인 황제(黃帝)와 "도덕경"의 저자로 전해지는 노자(老子)가 초인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신선으로 불리워서 황로신앙(黃老信仰)이 생겨났다. 방사들의 조작적인 선전과 참위설(讖緯說)의 유행이 황로신앙이 떠올랐다. 이러한 황로신앙을 더하여 신선방술의 내용이 조정되고 확대되었다. 그리고 신흥 종교였던 불교(佛敎)의 영향을 받아서 도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형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선사상은 중국의 도교 성격과는 달랐다. 도교가 종교의 형태로 형성되기 이전부터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莊子), 열자(列子) 등에 나오는 도가 사상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전래되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다.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도교와 도가사상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는 많았다. 도교와 도가사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도교는 어디까지나 종교이므로 근본적으로는 도가사상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도교는 초창기에 피안(彼岸)의 관념이 의외로 드물고 오히려 살아있는 현실의 행복(倖福)을 구하고 추구하는 성격이었다. 종교로서의 이론을 보강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고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도가의 사상이나 그 논리를 받아들여서 도교와 도가사상은 그 관계가 가까워졌다. 후한(後漢) 말년(2세기에서 3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는 정치의 파탄으로 혼란이 극심해지고 환관(宦官)들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심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고 의지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도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태평도(太平道)와 오두미도(五斗米道)라는 종교 집단이 생겨났다. 후한(後漢) 순제(順帝, 125년∼144년) 재위 시절에 우길(于吉, 干吉)이 태평청령서(太平淸領書)를 가지고 깨우쳐서 바탕으로 하여 종교집단을 만들고 그 도서명(道書名)을 따서 태평도를 세우고 전파했다. 중국 신선방술의 발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에는 고대로부터 도교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토착적인 고유한 문화현상으로서 산악신앙, 신선설 및 관련되어 연관이 있는 각종의 방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시대의 한반도에서 건국신화가 산악신앙 및 신선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조선의 건국 설화인 "단군신화"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듯 하다.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록에는 영류왕 시절에 당나라에서 도사(道士)에게 명령을 내려서 천존상(天尊像)과 도법(道法)을 가지고 고구려에 가서 노자를 강의하게 하였다. 고구려 왕과 고구려 백성들이 이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영류왕이 당나라(唐)에 사신을 보내어 불교와 노자의 교리를 배우기 원하니 당나라 황제 고조 이연(高祖 李淵)이 허락하였다고 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록에는 근초고왕 재위 기간에 태자 시절 근구수가 퇴각하는 고구려 고국원왕을 뒤쫒았는데 수곡성 서북에 이르자 장군 막고해가 도덕경을 빗대어서 말하기를 "일찌기 도가(道家)의 말을 들은 만족할 줄을 알면은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으니 이제 소득이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구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나자 근구수는 고구려왕 추격을 멈추었다고 한다. 도교는 제사 의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자료 출처 - 본인 작성, 목간으로 백제를 읽다(사회평론아카데미), NAVER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삼국사기(고구려본기, 백제본기) 참고.
'한민족 종교 그리고 신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천의식 백성의 축제 문화 (0) | 2025.03.31 |
|---|---|
| 산 山 나라 건국-제사 의식 (0) | 2025.03.24 |
| 일상생활의 신화 설화 영향 (0) | 2024.08.06 |
| 유교 불교가 낳은 폐해 폐단 (0) | 2024.06.08 |
| 자연 동물 숭배 문화 역사 (0) | 2022.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