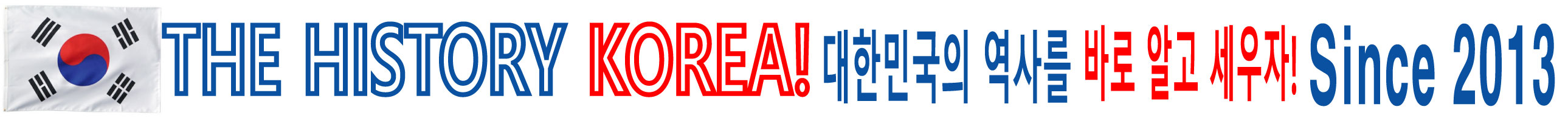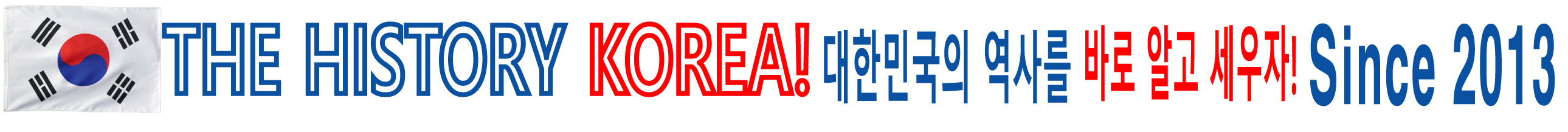상세 컨텐츠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를 시작으로 고대시대에 이르러서도 산(山)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건국했고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 의식이 이루어졌다. 산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존재이자 상징물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산 천제단(太白山 天祭壇) - 1991년에 국가민속문화재(現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천왕단(天王壇)이라고도 한다.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단을 중심으로 북쪽 뒤에는 장군단이 있고 남쪽 언덕 아래에는 하단(下壇)이 있다. 천제단에서는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제의를 하는데 이를 천제 또는 천왕제라고 한다. 태백산은 일찍이 신라 삼산오악(三山五岳) 중 북악(北岳)으로 이를 진산으로 여겨 나라에서 제사한 기록이 삼국사기 제사조에 전하며 고려사(高麗史)에도 무녀(巫女)가 참여하여 제의를 행한 기록도 전해진다. 이처럼 태백산은 이미 신라 초기부터 신산(神山)으로 여겨 제의를 행하여왔다. 천제단은 돌을 쌓아 만든 제단으로 높이 2.4m, 둘레 27.5m, 좌우너비 7.36m, 전후너비 8.26m나 되는 타원형의 거대한 석단이다. 남쪽에 있는 돌계단을 올라가면 단 상부에 제단이 있어 여기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올린다. 돌계단은 원래 아홉 단이어서 9단 탑이라 불리기도 한다. 개천절 때 제의는 원래 지방 관장(官長)이 맡았으나 지금은 선출된 제관에 의해서 집례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낼 때 소(牛)를 매어 신에게 바쳤는데 산에 소를 매어놓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려와야 했다고 한다. 천제단 중앙에는 칠성기와 현무기를 세우고 33천기와 28수기를 꽂았으며 제관들은 모두 흰색 도포를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관이 되면 1년 동안 목욕 재계를 하고 제사 때는 산에서 잠을 자고 자정 시간대에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인천광역시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仁川 江華 塹星壇) -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면적이 5,603㎡이다. 전통시대 단군 관련 문헌 기록에는 단군이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전해지며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이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국가 제사가 이루어졌다. 단군 왕검이 366가지에 이르는 나라 다스린 공을 세우면서 아울러 제천의 대례를 행하고 보본(報本, 생겨나거나 자라난 근본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갚음)의 뜻을 드높였던 곳으로 전해진다. 이 제천 의식은 1955년에 스포츠 운동경기 대회 "전국 체전"의 성화 채화를 계기로 부활되어 개천대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매년 양력 10월 3일 개천절에 거행되고 있다. 민족 제1의 성적(聖蹟)으로, 마니산 제천단(摩尼山祭天壇)이라고도 한다. 참성단에 관한 기록은 고려 때의 문헌 여러 곳에서 이미 나타난다. 고려 후기에 이암(李嵒)이 엮었다는 단군조선의 연대기인 단군세기(檀君世紀)에는 “…이 분이 단군이다 …제천단(마니산 참성단)을 쌓고 삼랑성(三郎城)을 쌓으시다(강화도 전등산에 있는 산성)”라는 기록이 있다.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국가 제사의 제단으로 활용되었다. 참성단 제사로는 임시제와 정기제가 있었다. 참성단의 제사는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국가의례가 유교식 의례였던 것과는 다르게 도교 의례 중에서 초제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성단에서 초제가 베풀어진 것은 고려시대부터 확인된다.
중국 요녕성 오녀산성(中國 遼寧省 五女山城)은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번시시(本溪市) 환런현(桓仁縣)의 오녀산(해발 806m)에 있는 고구려 왕성 유적이다. 오녀산의 정상 부분에는 사방이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별도의 시설이 없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구조이다. 산성 내부에서 고구려 초기의 대형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성의 전체 둘레는 4.57km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자연 절벽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돌로 성벽을 쌓은 곳은 남벽과 동벽의 일부 구간에 불과하다. 오녀산성은 그간의 고고학 조사 결과와 문헌 연구를 토대로 고구려 초기 왕성 유적으로 비정되고 있는 만큼 고구려 초기 도읍(졸본 부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하였다. 2004년에는 고구려의 다른 왕성, 왕릉 및 귀족 무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오녀산성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20세기 전반에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도쿄제국대학 인류학교실의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조선총독부 교과서 편찬사업의 사료조사를 위해서 1912년에 찾아갔다. 당시 도리이는 문헌 자료와 음운학적인 유사성, 그리고 답사의 내용을 토대로 오녀산성을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인 국내성(國內城)으로 비정하였다. 1944년에 발간된 만주의 사적(滿洲の史蹟)에 오녀산성을 비롯한 요동 지역의 여러 고구려 산성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제강점기에 이미 만주 일대의 많은 고구려 성이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녀산성은 산 정상부와 산비탈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사방이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남북 600m, 동서 110~200m 가량의 넓은 평탄지로 이루어진 정상부에는 대형 건물지와 주거지, 샘, 저수시설, 요망대(장대), 서문지 등이 있고 완만하게 경사진 동쪽 산비탈에는 남문지, 동문지, 성벽, 초소 유구 등이 있다. 산성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구려 전기, 고구려 중기, 고구려 후기, 금(金)에 해당하는 총 5기의 문화층이 발견되었다. 고구려 전기 문화층에서는 대형 초석 건물지 1기와 주거지 3기가 중기 후기 문화층에서는 대형 초석 건물지 2기와 주거지 35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른 시기의 주거지에는 내부에 노지나 간단한 부뚜막 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중기 이후의 주거지에는 내벽을 따라 쪽구들이 마련되었다. 오녀산성이 고구려의 초기 산상 도읍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명왕편에 소개되엇다. 구삼국사(舊三國史) 인용문에는 "7월에 검은 구름이 골령(鶻嶺)에 일어 사람들이 그 산을 볼 수 없었다. … 7일이 지나 운무(雲霧)가 스스로 걷히자 성곽과 궁실 및 누대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발굴조사에서 고구려가 오녀산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길림성 돈화시 동모산(中國 吉林省 敦化市 東牟山) - 동모산성(東牟山城)으로 보기도 한다. 서기 698년에 대조영(大祚榮)이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발해를 건국한 이후에 제3대 문왕 때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56년간 발해의 수도였다. 동모산은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300여리 되는 거리 지점에 위치하며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동모산 동쪽 4㎞ 지점에는 목단강(牡丹江) 상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고 산의 북쪽을 끼고는 오루하(奧婁河) 지금의 대석하(大石河)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대석하는 수도의 북쪽 방어선이었다. 동모산은 본래 숙신(肅愼)의 근거지인 홀한주(忽汗州)였는데 발해의 영토가 된 뒤에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가 되었다. 현덕부에는 노주(盧州), 현주(顯州), 철주(鐵州, 安市城), 영주(榮州), 흥주(興州)의 6개주가 속하였고 백암(白巖)을 비롯하여 26개현을 관할하였다. 동모산은 청나라(淸) 때 오라성(烏喇城)으로 백두산정계비를 세울 때 청나라 대표의 직함과도 관련있는 곳이다. 동모산 일대는 방어적 산성이었다. 목단강 건너 영승(永勝) 유적에 발해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이곳에서 동북 방향으로 10㎞ 정도 거리에 발해 왕족과 평민들이 묻혀 있는 육정산(六頂山) 고분군이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봉(金海 龜旨峰) - 구지봉(龜旨峰)은 김해시의 중심부로부터 북쪽으로 약 2㎞ 정도 떨어져 있는데 상봉우리(峰)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낮은 동산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야의 건국설화로 인하여 구지봉은 역사적인 봉우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지가(龜旨歌)의 산실인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구지봉은 봉우리의 모양이 넓은 원형으로 마치 거북이가 엎드린 형상과 같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가야 건국 설화에 따르면 가야 땅을 다스리던 아홉 추장이 구지봉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데 문득 하늘에서 알 여섯 개가 담긴 금합이 붉은 실에 매달려 내려왔다. 이튿날에 그 알 6개가 차례로 깨어지며 아이가 하나씩 나왔다고 한다. 그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나서 열흘째가 되자 모두 키가 아홉 자가 넘는 어른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맨 먼저 나온 이가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이 되었다고 전한다. 산봉우리 동쪽에는 수로왕비 허왕후릉(許王后陵)이 자리 잡고 있고 구지봉 정상에는 1976년에 세운 여섯 개의 알과 9마리의 돌거북으로 구성된 천강육란석조상(天降六卵石造像) 조형물이 있다. 그 북쪽 5m쯤에는 1908년에 건립된 대가락국태조왕탄강지지(大駕洛國太祖王誕降之地)라고 새겨진 비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거북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고의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거북 모양의 원래 모습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김해 구지봉은 2001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본인 작성, NAVER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8932,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5281,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6449,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6050), 우리역사넷(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r100495) 참고.
'한민족 종교 그리고 신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천의식 백성의 축제 문화 (0) | 2025.03.31 |
|---|---|
| 중국 대륙 도교 삼국시대 전래 (0) | 2025.02.21 |
| 일상생활의 신화 설화 영향 (0) | 2024.08.06 |
| 유교 불교가 낳은 폐해 폐단 (0) | 2024.06.08 |
| 자연 동물 숭배 문화 역사 (0) | 2022.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