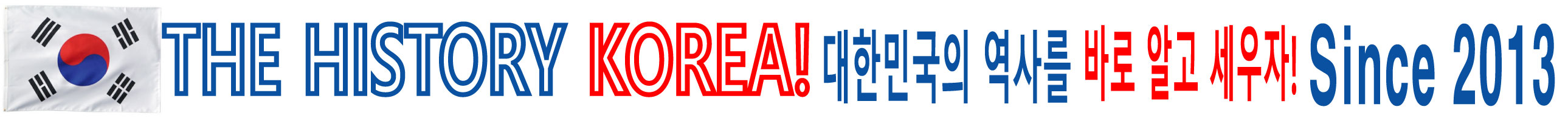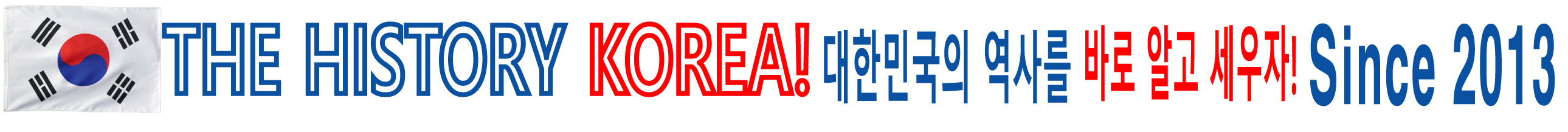상세 컨텐츠
본문

인류는 하늘을 숭배했고 인류는 하늘을 최고의 신(神)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민간신앙 샤머니즘에서 발전하여 종교가 생겨났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인류도 하늘을 숭배했고 하늘을 기리며 제사 의식을 하였다. 기원전 선사시대에서 고대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민간신앙(民間信仰)이 무속신앙(巫俗信仰)으로 이어져서 제사장(祭司長, Shaman)이 무녀(巫女)가 되었고 마을 마다 굿이 이루어졌으며 오래된 나무를 신성시 하였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제단을 차려놓고 제물을 바치고 기우제(祈雨祭) 등을 지냈다. 각자 가문(家門)의 조상신(祖上神)을 모시는 사당(祠堂)과 신궁(神宮)을 짓고 정기적으로 제사(祭祀)도 지냈다. 일반 가정에서는 문중을 대표하는 종가집에서 기일이 다가오면 제수음식을 장만해서 제사를 지내고 문상객들이 찾아와서 손님 대접이 끊이지 않았다. 명절에는 제사도 지냈고 묘소를 찾아가서 성묘(省墓)도 하였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중국(中國)을 거쳐서 불교(佛敎)와 도교(道敎)가 우리나라로 전래되었고 이어서 유교(儒敎)가 전래되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제례의식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중후반에 서양에서 천주교(가톨릭교, Catholic), 기독교(개신교, 改新敎)가 전래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 조선 조정에서 명을 내려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박해(迫害)를 하고 탄압(彈壓)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고대시대에 이어진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을 시작으로 백성들에게 축제였던 고유 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천제(天祭)는 우리나라의 천신숭배로서 부여, 고구려, 가락(가야), 신라, 고조선 등 상고대(上古代) 왕국의 창건주인 시조왕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격적인 존재로 인식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시조왕은 모두 하늘에서 강림한 천신이자 지상왕국의 왕으로서 섬겨진 존재로 여겼다.천신은 하늘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신격을 믿음으로써 생겨난 개념이다. 섬김의 대상인 천신은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등의 호칭 이외에도 제주도 지역 신화 설화에서 나오는 친지왕(親至王?, 天主),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은 옥황상제(玉皇上帝) 또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제석천(帝釋天), 가락국기(駕洛國記)에서의 황천(皇天),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의 상제(上帝) 등의 호칭도 함께 사용되어 왔다. 천제를 올리는 제단은 대개 산정(山頂)이나 산기슭에 위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공통적이다. 제단은 돌을 둥글게 모아 경계만 짓고 한 쪽에 제단을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천제는 매년 정월에 제를 올리는 세시의례와 수년 주기 혹은 특정한 시기에 날을 받아 제를 올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영고(迎鼓)는 상고시대 부여(夫餘)에서 하늘에 지낸 제천의식이다. 부여의 국중대회(國中大會)로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수렵 또는 농경의례 성격의 기원제(祈願祭)이자 감사제(感謝祭)이다. 문헌 기록에는 후한서 동이전 부여조(後漢書 東夷傳 夫餘條)에 “섣달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여러 날을 두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날이다. 이 기간에는 형옥(刑獄)을 다스리지 않고 죄수를 석방한다”라고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三國志 魏書 東夷傳 夫餘條)에는 “은정월(殷正月)이 되면 하늘에 제사 지낸다. 이때가 되면 온 나라 안에 모두 모여서 날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가 되면 감옥에서 형벌을 다스리지 않고 죄수들도 풀어 내보낸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동맹(東盟)은 고구려에서 10월에 행하던 제천의식이었는데 동명(東明)이라고도 부른다. 삼국지 후한선(三國志 後漢書)에서는 “10월로써 하늘에 제사하고 대회하니 이름하여 동맹이라 한다. 그 나라 동쪽에 대혈이 있는데 수신이라 부르고 역시 10월로써 맞아서 제사한다.”고 하였다. 위지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지만 “수신을 맞아서 나라 동쪽 높은 곳에 모시고 제사할 때 목수를 신좌에 모셨다” 라고 나온다. 수(隧)는 굴, 구멍, 대혈신(大穴神)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수(木隧)는 목각(木刻)의 굴신상(窟神像)이라는 뜻이 된다. 위지 동이전 한전(韓傳)에는 “5월에 씨 뿌리기를 마치고 난 뒤와 10월에 농사를 마치고 나서도 귀신을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동맹의 10월 제천은 농경의례로서 부족사회 공동체의 추수감사제였다고 볼 수 있다. 동맹은 고려의 팔관회(八關會)로 계승되었다. 동예는 3세기 무렵 강원도 지역에 분포한 부족집단의 이름이다. 동예는 매년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무천(舞天)이라고 부른다. 이때는 밤낮없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무천이란 말은 ‘춤으로 하늘을 제사한다’는 뜻이다. 거행 시기가 부여의 영고는 매년 12월이었고 동맹과 무천은 매년 10월이었다. 그리고 영고와 동맹이 나라 안의 큰 모임(國中大會)이었는 데 비해 무천은 그렇지 않았다. 무천은 "나라 안의 큰 모임"이란 의례로 국가 차원에서 거행되었다는 의미이다. 부여와 고구려는 국가 단계로 진입하는 사회였는데 동예는 폐쇄적인 부족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낙랑이나 고구려에 종속되어 있었다. 팔관회(八關會)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으로 고구려나 백제와 관련한 것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불교의례에 대한 기록이 신라에서 하였던 팔관회에 관한 것이다. 신라에서 진흥왕이 고구려에서 온 승려 혜량(惠亮)을 승통(僧統)으로 삼고 551년(진흥왕 12년)에 처음으로 백고좌회(百高座會)와 팔관의 법을 두었다고 한다. 당시 신라의 거칠부(居柒夫)가 고구려를 침공하여 10군을 공취하고 승려 혜량을 모시고 돌아오자 진흥왕은 그를 승통으로 삼았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150여 년 뒤인 527년(법흥왕 14년)에 이차동의 순교 행동으로 불교를 공인하였는데 위 기사에 의하면 불교의례로서 팔관회의 설행이 신라에 들어온 고구려 승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고구려에서는 신라에 앞서 이미 팔관회가 설행되고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혜량이 전한 팔관회는 전몰장병을 위한 위령제의 성격이 있었는데 이는 중국의 팔관회가 위령제로 설행되고 있어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연등회((燃燈會)는 551년(진흥왕 12년)에 팔관회(八關會)의 개설과 함께 국가적인 행사로 열리게 되었고 특히 고려 때 성행하였다. 불교에서는 불전(佛前)에 등을 밝히는 등공양(燈供養)을 향공양(香供養)과 더불어 중요시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불전에 등을 밝혀서 자신의 마음을 밝고 맑고 바르게 하여 불덕(佛德)을 찬양하고 대자대비한 부처에게 귀의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조선시대에 궁궐 종묘 장소에서 거행하는 제향 의식이다. 조선시대에 왕실의 제사 가운데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으며 엄격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4절기와 명절 세시풍속은 불교, 유교, 도교, 민간신앙, 무속신앙, 예수교 등의 영향을 받았다.
*본인 작성, NAVER 검색,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4993 https://folkency.nfm.go.kr/topic/%EC%98%81%EA%B3%A0 https://folkency.nfm.go.kr/topic/%EB%AC%B4%EC%B2%9C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4249&cid=46670&categoryId=46670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6751 ),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r200400 ) 참고.
'한민족 종교 그리고 신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 山 나라 건국-제사 의식 (0) | 2025.03.24 |
|---|---|
| 중국 대륙 도교 삼국시대 전래 (0) | 2025.02.21 |
| 일상생활의 신화 설화 영향 (0) | 2024.08.06 |
| 유교 불교가 낳은 폐해 폐단 (0) | 2024.06.08 |
| 자연 동물 숭배 문화 역사 (0) | 2022.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