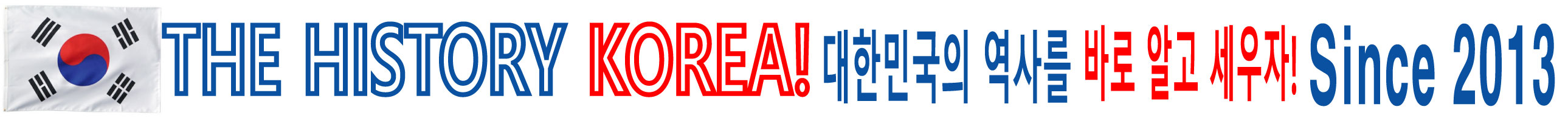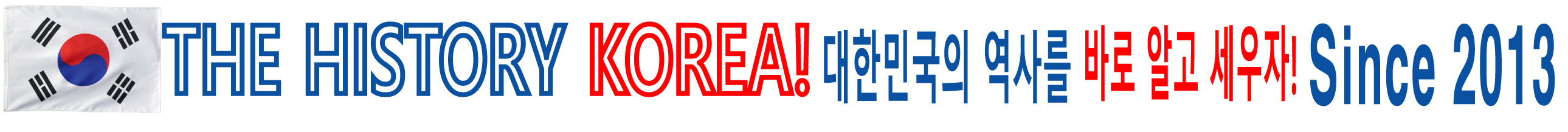상세 컨텐츠
본문


오래전에 선사시대부터 원주민들은 문자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동굴이나 암벽에 자신들의 생활상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하여 남겼다. 척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고생스러운 일상에 왜 굳이 이러한 일들을 하였을까. 아마도 자신들이 죽고 난 이후에 뒤를 이을 후손들에게 자신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한반도 남쪽에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격화(蔚州大谷里盤龜臺巖刻畵) 유적이 남아있다. 1971년 문명대, 김정배, 이융조가 발견했는데 1995년에 국보(國寶)로 지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약 300여점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 중에서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그림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삼국시대 고분 벽화로는 상대적으로 고구려 고분(高句麗古墳)에 많이 남아있고 많이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고구려 영역 안에서 축조된 무덤들이다. 전기 시대에는 적석총(積石塚, Burial cairn)이 주로 만들어졌고 후기 시대에는 봉토분(封土墳, Mound Tombs)이 주로 만들어졌다. 봉토분 가운데 매장부인 석실(石室, 돌방)에 벽화를 그린 석실 벽화 봉토분이 있다. 초기 벽화에는 주로 생활 풍속도가 그려졌고 후기에는 사신도(四神圖-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그려졌다. 봉토분을 대표하는 것은 벽화분이다. 벽화분은 무덤 내부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것으로 기단봉토분(基壇封土墳)과 적석총 중에도 벽화분이 흔치 않게 있다. 고구려 고분은 분구의 축조 재료와 매장 방식, 벽화의 있고 없고 등에 따라서 여러 형식으로 나뉘며 시간과 지역에 따라 여러 양상의 모습을 보인다. 삼국시대에 한반도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부처를 그린 그림과 조각 그리고 건축물이 발달하게 되었다. 기록 면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림을 그려서 장식하고 돌벽에 그림과 글자를 새기고 돌을 깎아서 불상과 탑 등의 조형물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 탱화(幀畵)는 천이나 종이에 그려 족자, 액자의 형태로 벽에 거는 불화(佛畫)를 가리킨다. 현재 전해지는 불화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불화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인다. 고려시대 전기까지의 불화는 주로 벽화로 그려졌는데, 점차 제작이 간편하고 이동이 쉬운 탱화가 많이 그려졌다. 사찰 전각 안에서 피우는 향 때문에 색이 변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박락(剝落)되어 같은 내용의 그림을 다시 그려 걸기도 하였다. 전문 화사가 아닌 불교회화를 담당하는 승려가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홍도와 같은 화가도 탱화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다. 부처의 일화나 생애 등 경전의 내용을 담은 상단탱화, 시왕도와 지옥도와 같은 중단탱화, 신장상 등이 묘사된 하단 탱화로 구분된다. 20세기 후반의 민중 미술에서 민중의 신앙 대상인 탱화의 도상을 차용하여 사회 비판의 도구로 삼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민중 화가로크게 두명 화가가 거론이 된다. 주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을 그린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와 당시 보수적인 사회였지만 성풍속도를 파격적으로 그린 혜원 신윤복(蕙園 申潤福)이 있었다. 그리고 고산자 김정호(古山子 金正浩)가 살아있을 동안 평생을 조선 팔도 돌아다니면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완성하여 남겼다.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하며 병풍(屛風)이나 가구 등에 십장생(十長生, Ten Symbols of Longevity)을 그림 그려넣고 새겨넣어 장식하였다. 해(태양), 산, 물, 돌, 구름(달), 소나무, 불로초, 거북이, 학, 사슴 또는 대나무가 십장생에 해당한다. 유교(儒敎)의 영향을 받아서 양반 선비는 매화, 난, 국화, 대나무를 그림 그리고 글을 남겼다. 매화, 난, 국화, 대나무를 합쳐서 사군자(四君子)라고 부르는데는 한자 문화권에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네 가지의 식물을 일컫는 개념이다. 각 한자를 따서 매란국죽(梅蘭菊竹)이라고도 부른다. 학식과 인품, 덕이 높은 사람에 비유하여 '군자'라 불렀다고 한다.높은 기상과 품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유교 사회에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군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다. 그래서 고난과 악조건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사군자를 통해서 선비들은 변함없는 신념과 굽히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고자 했다. 뜻이나 품격 따위가 높고 우아해지고 싶었고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속세에서 벗어나는 경지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본인 작성, NAVER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 검색, 나무위키 참고.
'다양한 해석과 탐구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멸망한 나라 유민 재건 반란 (0) | 2025.03.07 |
|---|---|
| 희노애락 동고동락 군사 반란 (0) | 2025.02.28 |
| 배움과 창작의 과정 성장 성숙 (0) | 2025.01.17 |
| 세상의 변화 역할 리더의 반란 (0) | 2025.01.14 |
| 반란 또 다른 목적 충돌 반란 (0) | 2025.01.06 |